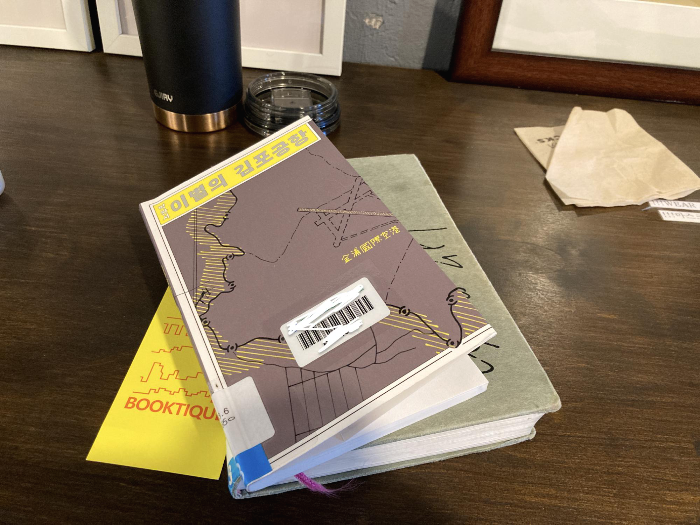
서론 - 공항...??
책이 얇아요. 이름도 개인적으로 취향입니다. 공항에 갈 때면 왠지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미리 가서 할 일을 하던지 뭔가를 읽곤 하는데, 공항을 묘사한 이야기라니! 도서관에서 보자마자 곧바로 읽고 싶은 마음이 바로 생겼습니다.
다만 읽어본 뒤에는 아쉽게도 공항에서 벌어지는 무언가의 일과는 거리가 멀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또한 이 책은 제가 처음 읽었던(앞 독후감 참조) 90년대에 출간한 책이라 그랬는지 술술 읽혔던 앞의 책들과 달리, 작가의 등단 초기(1970년대)에 써낸 단편 소설들을 엮어낸 소설집이라 조금은 덜 몰입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내용과 느낌 - '이별의 김포공항'
네,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 책은 '김포공항'보다 '이별'에 더욱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이었습니다.

'이별의 김포공항'은 대략 1970년대를 배경으로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는 노파가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김포공항 비행기를 타기 며칠 전부터 이륙하는 순간까지를 담담히 풀어낸 단편소설입니다. 겉으로는 6.25 전쟁 직후 동경하는 미국으로의 이주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아들 딸들을 윽박지르며 핀잔을 줬지만, 떠난 뒤에는 괌, 서독, 브라질 등을 마치 서울 옆동네인양 속으로 되뇌이며 거드름을 피우는 노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있든 속으로 언제나 '자식내미'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비춰져서 제 할머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탄 승객들과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륙을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묘목처럼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충분히 뿌리내리고 살 사람들이며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체념하는 순간(여생을 낯선 곳에서 딸과 함께 보내는 듯한 암시가 있었어요),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이미 말라버린 노송이 자신의 처지와 같다는 것을 느끼며 이륙하는 비행기 속 대성통곡하는 모습으로 끝마칩니다.
이처럼 '이별의 김포공항' 소설집은 겉으로는 잘 포장한 안정과 행복 속 불안한 내면의 측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별의 김포공항'과 비슷한 총 4개의 소설집을 엮어낸 단편소설집입니다.
다른 3개의 단편소설 - 짧은 줄거리
은행에 다니는 남편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포에서 월세까지 받는 나름 유복한 집안에 있다가도 젊은 날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외출한 중, 우연찮게 만난 학생 시절 국어선생님과 연애를 하다 이별하면서 헛헛함만 늘어난 채, 국어 선생의 사뭇 '지렁이 울음소리' 같은 듯한 비명과 신음 소리가 어떨까 상상하면서 마치는 '지렁이 울음소리',
올케와 오빠의 죽음으로 어릴 적부터 조카를 키우며, 자식만큼 조카에게 정을 쏟는 '나'와 이를 버거워하며 피하는 조카에게 공허함을 느끼는 부분을 담아낸 '카메라와 워커',
여러 번의 재혼 이후 만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오고, 인맥을 찾아 성공하자는 남편의 등살에 떠밀리다시피 동창들을 만나 얘기하면서 과거의 기억에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세 소설 모두 내면의 불안한 측면을 담아낸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느낌 - 박완서 특유의 해학과 당시 서울 사람들의 내면 속 불안함
70년대, 겉으로는 유복하고 행복해보일지 몰라도 속은 여러 상흔과 쓸쓸함으로 남아있는 여러 여성 주인공들의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인, 나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너무 진지하지 않게 중간에 넣어놓은 박완서 특유의 해학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행복한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나 근심을 안고 사는 현대인들을 보자니, 기술과 먹는 것들, 환경만 조금 달라졌을 뿐 2021년을 사는 서울 사람들과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내면이 별 다를 것이 없어보인다는 느낌도 드네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박완서 소설의 주요한 매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고는 있어도 자세히는 모르는 일제 시대와 6.25 시대의 생채기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0) | 2021.03.01 |
|---|---|
| 투자는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 - 디 앤서 (2) | 2021.02.08 |
| 인연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루한 사랑이야기 - 대설주의보 (0) | 2020.11.22 |
| 바이든 이펙트 - 조 바이든 이후는 어떻게 될까? (바이든 책) (4) | 2020.11.17 |
| 세계사를 바꾼 6가지 음료 - 메소포타미아 맥주부터 21세기 콜라까지 (0) | 2020.11.11 |



